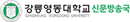히말라야, 히말라야,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내겐 상상 속에 있는 신화 같은 이름이었다. 그것이 혜성처럼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운동으로 체력이 단련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나이 육십에 언감생심이었지만 회갑기념을 내세우며 설득한 동생을 따라 나선 터라 시작부터 불안은 계속 마음 밑바닥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카튜만두에서 출발하여 정오의 햇살이 우리를 반기는 포카라 공항에서 듬직한 셰르파 Ramesh와 함께 택시를 타고 두어 시간 히말라야 초입인 담푸스에 도착하였다. 휘감긴 히말라야 계곡 계곡을 돌 때마다 안나푸르나와 마챠퓨차레 봉우리들은 매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곳은 집들도 사람들도 모두 자연이 되어있었다. 골짜기마다 게으르게 누워있는 작은 집들에는 어김없이 건포도처럼 까만 눈동자의 네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 아이들은 가난이나 불행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이 구걸은커녕 오히려 잔잔한 풍요와 넉넉한 평안으로 넘쳐나 있었다. 한 소녀가 노오란 유채꽃을 따다가 나의 머리에 수줍게 꽂아주었다. 트래킹을 하면서 버리고 싶었던 일상의 감정의 찌기 들이 하나 둘 녹아내리고 나도 네팔 사람처럼 자연에 묻혀갔다.
비록 ABC(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토르가, 좀 롱, 타다 파니와 고 라파니를 통해 3120m 푼 일을 찍고 힐레포 내려와 사랑 고지까지 7일의 여정 동안, 하루 8시간에서 많게는 13시간 동안 트래킹을 하고, 경사 45도도 넘어 보이는 가파른 계곡을 숨 막히며 오르고, 저녁 라지에 들어가면, 열 패드를 붙인 슬리핑 백에 의지하여 시체처럼 곯아떨어지는, 더운물이 없으니 몸을 씻기보다는 닦아내며, 이 모든 것이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힘든 기억보다 행복한 기억이 더 크다.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는 매일 밤 쏟아지는 별들의 향연은 지금도 생각하면 숨이 멎을 것 같이 설렌다. 히말라야 램지(range)가 다 보이는 찬란한 픈 힐의 일출은 가히 경이로웠다. 손톱만 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암흑 속에 있던 모든 봉우리들이 다양한 형태와 색을 자랑하며 자태를 드러낼 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감동의 눈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장한 산악인인 할아버지와 함께 온 코스모스 같은 소녀의 든든한 후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유방암으로 치유 중인 어머니와 함께 오지 못해 아쉬워하는 어느 대학생을 만났을 때 오래 전에 떠나보낸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잠시 먹먹했던 기억, 2년 동안 한국에서 돈을 벌어 작은 라지를 운영하는 네팔 사장님의 통쾌한 웃음, 하루 18시간을 걸었다는 무소의 뿔처럼 당당한 독일에서 온 독신녀, 4개월간 인도와 네팔 현지 수업 중인 대안학교 학생들...
이 모든 스토리를 히말라야에 묻고 가슴에 묻으며 희망으로 가는 고난의 진지함은 오래 기억될 것 같다. 희망은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라 했던가. 언젠가 그 길을 걸을 때 히말라야 자락에서 깔깔깔 웃음꽃 피는 영동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만나고 싶고 꿈과 몸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모습도 보고 싶다. 7일 동안의 히말라야 트래킹은 60 이후의 새 길을 가는 전환의 길목이 되어 나도 넉넉함으로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