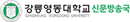영화 ‘소셜포비아’를 보고

SNS의 파급력과 그로 인한 부작용들은 여러 번 입에 오르는 소재이다. 실제 악플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개인정보의 노출로 프라이버시는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문제를 영화화 한 것이 ‘소셜포비아’이다. ‘소셜포비아’의 뜻은 타인 앞에서 어떤 사회적 불안을 경험한 후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회피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기능이 저하 혹은 상실되어가는 정신적 질환을 의미한다. 영화는 익명성에 기대어 막말을 하는 사이버 폭력이 실명의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탈영 군인의 자살 뉴스에 남성비하 댓글을 단 악플러 민하영을 처단하기 위해 남성들은 현피(현실 Player Kill의 준말. 웹상의 싸움이 실제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원정대를 결성하여 그녀의 신상을 털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양게를 중심으로 마녀사냥을 하러간다. 그녀의 집에 찾아가자 그들은 맞은 건 그녀의 시체였다. 시체를 목격하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신고가 아닌 SNS에 자신이 쓴 악플 지우기였다. 그 모습이 개인방송을 통해 퍼지면서 그들을 향해 살인자라는 화살이 돌아갔다. 그들은 민하영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다며 타살 증거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마녀사냥과 이것을 개인방송으로 생중계 하면서 만든 비극, 그 비극마저 가지고 노는 군중들, 자신들 탓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온라인에서 인간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도 오프라인에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적인 공감이 필요한 글에 달리는, 소위 말하는 관종(관심을 바라고 자극적이게 행동하는 사람)의 댓글에 몰리는 분노의 반응들은 이제 익숙하다. 이슈에 대한 동정과 분노의 파도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뀐다.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려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자신들이 세계 평화주의자가 된 마냥 자극적인 말로 논리와 생각을 펼쳐대면서 남을 깎아 내리기 바쁘다.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 세계는 사람이 죄의식을 쉽게 느끼지 못하며, 내가 하는 공격의 세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영화가 문제의 해결방안을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손가락에 일종의 경고를 주었다고 생각한다.